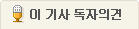|
불이다.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.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불이 아파트 뒤, 빈 공터를 사정없이 집어 삼키더니 이제는 양옆으로 번져 아파트 전체를 통째도 태울 듯 무섭게 치솟기 시작한다.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, 그 인파 속엔 두려움에 화석이 된 것처럼 굳어버린 나도 있다.
남편이었다. 타오르는 불길에서 구해준 사람. 새벽 4시쯤 되었을까. 무슨 꿈을 꾸기에 캄캄한 허공에 두 팔을 휘저으며 자냐고 하는데도 멍한 채 한참을 생생한 꿈속에 머물러 있었다. 정신이 들고서야 아찔한 그 불길이 꿈이었다는 게 다행스러울 뿐이었다.
그날 저녁 남편이 선물이라고 내민 봉투 한 장, 생일도 기억 못하는 남자가 웬일인가 싶어 열어 본 봉투 속. 그러면 그렇지, 사람이 쉽게 변할 리 없지. 봉투 안에 얌전히 누워있는 것은 기대했던 현금도 상품권도 아닌, 달랑 로또 한 장이었다. 자기가 꾼 꿈도 아니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를 샀다는, 어이없는 이 남자.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될 줄이야. 로또 한 장 아니 꿈 한 조각이 서서히 날아올라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.
발원지는 마스크였다.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늘의 별이라도 된 듯 도도하기 이를 데 없었다. 발품을 팔고 시간을 갖다 바쳐도 좀처럼 손에 들어오지 않던 마스크. 그 마스크가 마법같이 손가락 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사흘 연속 내 품에 쏙쏙 안기는 것이다.
작년 2월 초부터 시작된 마스크 전쟁. 질 좋은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이른바 착한 기업들.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으로, 컴퓨터로 딸아이와 마스크 구매 대전을 벌였지만 손끝에서 일이분만에 매진되는, 촌각을 다투는 시간 전쟁에 번번이 패해 거의 전의를 상실해갈 즈음이었다.
불길 치솟는 꿈에서 깬 이튿날 아침.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9시 정각에 판매하는 마스크 사이트를 열어 놓고 딸아이와 카운트다운을 헤아리고 있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. 한 달 여 동안 굳게 닫혀있던 구매창이 푸른 한강처럼 시원하게 펼쳐지더니 결제완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. 그것도 손놀림 빠른 딸아이가 아닌 내 손끝에서 탄생했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았다.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딴 듯 한참을 기쁨에 겨워 헤어날 줄 몰랐다.
행운의 불길은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. 전날의 그 기세를 몰아 다음날 오전 9시 45분 또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연속으로 성공하게 되어 얼떨결에 가족들로부터 ‘꽝손’ 아닌 ‘황금손’으로 불리는 영광도 얻었다. 다만 그것이 상처투성이 영광이 될 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.
마스크가 세 번째 성공하던 날, 저녁 뉴스를 보던 남편이 ‘강원도 감자 한 상자를 5천원에 판매하는데 이번엔 감자구매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? 라고 하는 것이다. 마스크로 인해 기세등등해진 탓인지 바로 귀가 솔깃해져 다음날 오전 10시 정각, 감자 사이트를 열어놓고 휴대폰으론 내 아이디를. 인터넷으론 딸아이 아이디를 사용하여 각각 두 상자씩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다. 나흘 내내 행운이 무섭게 치솟은 것이다.
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기 마련이다. 남편이 선물이라고 준 로또는 정작 불씨조차 살릴 수 없는 ‘꽝’으로 끝났고, 시댁과 친정으로 각각 한 상자씩 보낸 후 남은 것은 이제 감자 두 상자. 행운을 연거푸 가져서일까. 감자가 도착한 날부터 타버린 불길에 피식피식 흰 연기만 날리는, 꺼진 후의 빈 산 같은 허탈함이 점점 내 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.
남편이 내게 감자를 사라고 의욕을 불어넣은 것이 애초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았다. 염색한 지 15일이면 새록새록 돋아나는 흰 머리가 귀찮아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하루에 한두 번 백일동안 감자껍질 우려낸 물로 머리카락을 마사지하면 나중엔 염색할 필요 없이 까맣게 된다는 남편의 말. 그때부터였다. 감자가 불길보다 무서워진 게. 감자더미가 치솟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냉장고에 쉴 새 없이 쌓여가는, 껍질 벗겨진 감자들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.
처음엔 한두 번 하다 말겠지,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그만두겠지 싶었다. 그런데 걸쭉한 감자껍질 물처럼 남편의 끈기 역시 대단했다. 언제부터 이토록 끈끈하고 한곳만 바라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, 남편의 끈기가 대단할수록 내 맘은 울퉁불퉁 감자 산으로 하루하루 지쳐만 갔다.
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, ‘감자의 꿈’이란 글씨. 강원도 로고와 함께 무심코 지나쳤던, 상자에 적힌 그 글자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. 감자는 대체 무슨 꿈을 꾸며 여기까지 온 것일까. 완판의 꿈 아니면 매일 사람 손에서 다채롭게 변신되는, 맛있는 자신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.
그날부터였다. 마스크로, 감자로 치솟았던 열기를 잠재우기로 한 것이. 대신 감자처럼 나도 꿈을 쏟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. 코로나로 인한 막힌 일상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한테 쓸데없이 짜증만 내고 또 그것을 풀기 위해 다른 곳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. 정작 열정 쏟을 일은 불씨마저 희미한데 엉뚱한 불길만 온힘을 다해 지폈던 것 같다.
다시 새롭게 타오르는 불길, 그 불길이 멀리 달아나기 전에 도로 갖다 놓아야 할 것 같다. 상자 속에서 감자들이 다채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듯 글 한 조각 한 조각이 서서히 날아올라 맛있게 타오를 수 있도록 오랫동안 닫힌 그 빗장을 조금씩 열어본다. 감자의 꿈처럼 나도.
<저작권자 ⓒ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|
인기기사
9
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
|